2012. 4. 8. 09:17ㆍC.E.O 경영 자료
1조원 기업의 저주…10곳 중 3곳 매출 일 년도 못 지켜
매경이코노미 입력 2012.04.07 15:27
꿈의 1조원.
지난해 결산 성적표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누가 새로 연매출 1조원 클럽에 가입할지 관심사다. 연매출 1조원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초석이다. 보통 매출액 1000억~1조원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한다. 정부 정책상 기업을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지원은 못 받고 조세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에 빠진다.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선 중견기업은 무한경쟁시장에서 정부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견기업위원장인 이희상 운산그룹 회장은 "매출 1조원은 모든 중견기업의 꿈이다. 1조원을 돌파해야 웬만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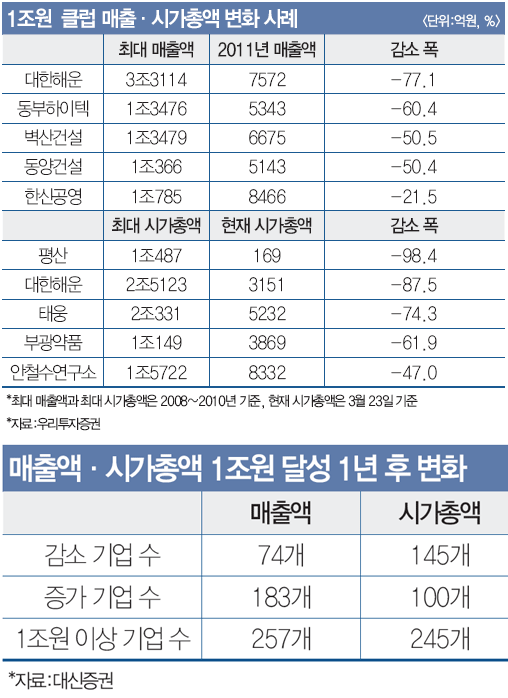

그러나 한편 1조원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다. 1조원 클럽에 가입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도 버겁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실제로 한신공영, 대한해운 등 매출 1조원 문턱에서 헤매는 기업이 적지 않다. 2000년 이후 매출액 1조원 이상을 달성한 상장사는 총 257개. 그러나 이 가운데 74개 기업(29%)은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지 1년 만에 매출액이 떨어졌다. 기업 10개 중 3개는 1조원 클럽 가입 1년 만에 다시 나왔다는 얘기다.
기존 사업 답습…매출 제자리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한 데 원인이 있다. 한신공영은 2009년 처음으로 매출 1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이듬해인 2010년에도 1조198억원을 기록하며 안착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8466억원을 기록하며 2010년 대비 16.3% 감소했다. 한신공영은 공공 건축 비중을 높여가며 매출을 키웠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금융위기 한파에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는데도 공공 부문에 매달리다 늘어난 매출을 고스란히 내줬다. 새로운 영역을 뚫지 못한 게 한계였다. 1조원 달성의 원동력이었던 공공 건축 매출이 도리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된 셈이다. 한신공영의 매출 비중에서 공공 부문은 전체 매출액의 80%를 넘는다. 1조원을 내준 한신공영은 올해부터는 민간 부문 사업 비중을 30%까지 늘려 1조원 클럽 재가입을 노린다.
둘째, 무리한 확장이 1조원에서 더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1조원이라는 수치에 취해 욕심을 부리다 역풍을 맞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했던 대한해운은 한때 매출액이 3조원을 넘는 건실한 회사였다. 2008년 매출액은 3조3114억원. 그러나 2009년 2조2793억원으로 주저앉더니 급기야 지난해는 9월 기준 6082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매출액을 합쳐도 7572억원에 불과하다. 대한해운은 배를 빌려 중간 이윤을 더해 다른 선사들에 배를 빌려주는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해운업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한해운에서 배를 빌린 선사들이 용선료를 지불하지 못했고 이는 대한해운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급기야 지난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시작했던 용선 사업 확장이 기업의 목을 죄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분사도 매출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 경우 사업 부진이 매출 감소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동부하이텍은 2009년까지 매출액 1조원대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2010년 5934억원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역시 5343억원으로 5000억원대를 맴돈다. 매출이 떨어진 원인은 분사다. 2010년 농업 부문이 동부한농으로 분사했고 반도체 사업 부문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1분기 10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증시흐름 따라 시총 들쑥날쑥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조원의 저주는 통용된다. 시가총액 1조원 달성은 주식시장에선 우량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올해 시총 1조원 이상 종목은 코스피 142개, 코스닥 10개(2월 29일 기준)다. 주가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다. 때문에 당장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 시총 1위인 셀트리온의 지난해 매출액은 2786억원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4조215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총 1조원은 매출 1조원보다 부침이 더 심하다. 2000년 이후 시총 1조원 이상을 기록한 종목 245개 중 1년 뒤 시총이 더 커진 종목은 100개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145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감소했다.
시가총액 1조원 클럽은 증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2002년 말 40개에 불과했던 1조원 상장사는 2005년 101개, 2006년 110개로 계속 늘어나더니 2007년 코스피지수가 2000을 넘기자 137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뒤 증시 폭락으로 시총 1조원을 달성한 기업은 102개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도 비슷했다. 지난해 7월 시총 1조원을 넘긴 기업 수는 163개에 달한다. 주가 폭락과 함께 변동성 장세로 바뀌자 지난해 말 시총 1조원을 넘긴 기업은 151개로 감소했다.
산업 분위기도 시총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동아제약, LG생명과학, 부광약품 등 제약주는 신약 개발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총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로 타격이 컸다. 동아제약의 2008년 이후 최대 시가총액은 1조5255억원이지만 현재는 9000억원대로 약 40%가량 감소했다. 동아제약은 매출액도 1조원 턱밑에서 맴돌고 있다. 부광약품 시총은 1조149억원에서 3800억원대로, LG생명과학은 1조2400억원에서 59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4월로 예정된 대규모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업체들의 이익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해외 수출 확대와 연구개발(R&D) 성과로 주가 회복이 기대되지만 국내 기업의 영업환경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제약주 투자의견을 대부분 '유지(홀드)'하거나 목표주가를 내린 상태다. 투자의견 '매수' 일색인 증권가에서 '유지'는 사실상 '매도'와 다를 바 없다.
제약업계처럼 산업 분위기에 따라 울고 웃는 업종이 많다. 게임산업이 한창 호황일 때 게임업체들은 시총 1조원을 훌쩍 넘겼다. 예를 들어 네오위즈게임즈는 2010년 10월 시총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8월 2조원까지 바라봤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며 현재 7000억원대에서 맴돈다. 역시 한때 2조원 넘는 시총 규모를 자랑했던 태웅은 풍력시장이 주춤하자 5000억원대로 감소했다. 메가스터디는 정부 교육정책 때문에 성장성에 제동이 걸려 1조5000억원대까지 올라갔던 시가총액이 반 토막 났다.
특히 정치적 이슈 등으로 테마주로 엮여 휘말린 기업들은 시총 1조원 유지가 쉽지 않다. 안철수연구소가 대표적 사례다. 안철수연구소는 지난해 10월 24일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섰지만 다음 날부터 주가가 떨어지면서 나흘 만에 5000억원대로 감소했다. 11월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다시 1조원대에 진입했지만 진입하기 무섭게 주가가 다시 떨어지며 7000억~8000억원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1조5000억원대까지 치솟았던 안철수연구소 시가총액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1조원대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주가 변동이 극심해 안착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전문가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에 따른 주가 폭등은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안철수연구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9월 기준 663억원으로 2010년에도 698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투자자들을 몰고 다녔던 바이오주도 비슷한 모양새다. 메디포스트, 젬백스, 씨젠 모두 1조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시가총액은 7000억~8000억원대에서 움직인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지난해 9월 누적 기준 메디포스트 193억원, 젬백스 181억원, 씨젠 394억원(12월 기준)으로 500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미래 성장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가시적인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1조원 안착은 무리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급등해 시총 규모가 커진 기업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국 주가 거품이 걷혀 다시 줄어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밀물처럼 들어온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썰물 빠지듯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명순영 기자 msy@mk.co.kr / 조은아 기자 echo@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51호(12.4.04~4.10일자) 기사입니다]
'C.E.O 경영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귀뚜라미 덕분에 '억대' 소득? 곤충산업이 뜬다 (0) | 2012.04.08 |
|---|---|
| 기재부 "세계 인구 절반 물 부족…물산업 육성해야" (0) | 2012.04.08 |
| 삼성전자 직원 1인당 月 2000만원 벌었다 (0) | 2012.04.07 |
| “무역 2조달러 달성 걸림돌은 저출산” 24.5% (0) | 2012.04.07 |
| 멕킨지 "미래는 부모보다 자식이 가난한 세대" (0) | 2012.04.07 |